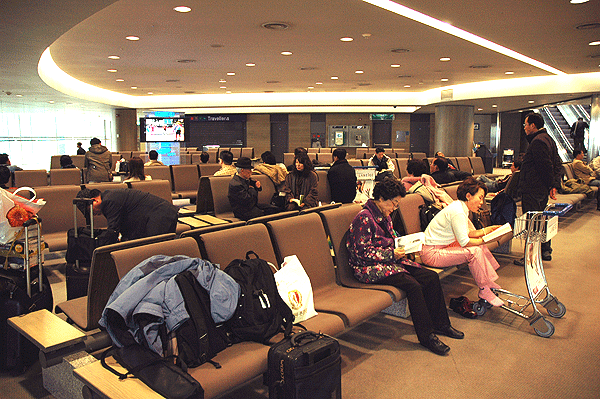여행 첫째날
여행은 하늘을 나는 새가 되는 것. 작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가 거칠 것 없이 창공을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되어 길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던 날 인천공항에는, 속살이 보일 듯 말 듯 한 신부의 면사포처럼 안개가 살포시 내려 앉아 있었다. 그 정도쯤의 안개야 거뜬히 뚫고 날것이라 생각했는데, 1시에 출발할 예정이던 중국민항은 공항에 아예 들어오지 조차 않아, 기내식을 먹으려던 우리는 공항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로 대충 점심을 때워야했다. 의자에 앉아 졸다가 정신을 차리고, 학구열이 대단한 모모의 지시 대로 지도를 보며, 갈 곳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공항 방송의 안내에 따라 출발선을 세 번이나 옮겨 다니며, 다섯 시간을 기다려 6시가 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막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은 회색 구름이 뒤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저 멀리 오른쪽 끝에서 노을처럼 붉은 구름이 간간히 나타나 지루함을 덜어 준다. 두 시간을 날아간 끝에 비행기는 중국의 영공을 날고 있었지만, 지상엔 불빛이 많지 않아 도시는 어둠속에 가라 앉은 고도와 같았다. 항주 공항에 내린 일행은 대기하고 있던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도저성이 있는 임해로 향했다.
일찍 도착 했더라면 고속도로 옆의 풍경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정월 대보름의 달빛에 불 꺼진 집들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연립주택처럼 줄지어선 집들이 많았지만, 불이 켜진 집은 열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었다. 전기가 부족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6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창밖엔 간간히 비까지 내린다. 그래도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나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어두운 창밖을 눈이 빠지게 내다보았다. 세 시간을 달려 임해에 도착하여 임해에서 제일 좋다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기름을 덜 넣어서 만든 음식이 먹을 만 하다고 하는데, 나는 향료 때문에 도무지 입에 맞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배가 고파 참을 수 없는 우리 두 사람과 이동륜 선생님은, 무언가 먹을 만 한 것을 찾아 호텔 밖으로 나왔다. 뭔지 모를 음식을 파는 곳이 즐비하여 들여다보니, 석 달 열흘을 안 닦았는지 튀김 솥과 그릇들이 새까맣게 땟국에 절어 있어 되돌아 나오고 말았다. 호텔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는 리어카에서, 먹음직스런 꼬치구이가 불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기에, 세 개를 사서 하나씩 들고 한 잎 베어 먹었는데, 짜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 먹을 수 없었다. 여행에서 지켜야 할 것 중에 그곳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여행의 참 맛이라 했고, 그래야 현지인들과도 벽 없이 친해진다 했는데 나는 아직 여행의 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호텔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날 밤 고달픈 여행객은 얇은 이불 속에서 두 무릎을 가슴까지 올리고 웅크리고 잠을 자야했다.
인천 공항에서 지루한 시간
짜고 맛 없는 꼬치구이
'최부의 표해록 여행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둘째 날 - 도저성 1 (0) | 2014.12.18 |
|---|---|
| 둘째 날 - 도저성 2 (0) | 2014.12.18 |
| 둘째 날 - 도저성 3 (0) | 2014.12.18 |
| 둘째 날 - 우두외양 (0) | 2014.12.18 |
| 둘째 날 - 신라방 (0) | 201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