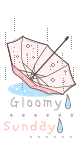비는 내리고
|
잠에서 깨어 머리 맡에 놓아 둔 휴대전화로 시간을 보니 8시 28분이다. 조금 꾸물 거리다가 일어나, 빛이 잘 들어 오지 않아 어두운 거실에 불을 켜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하늘이 어둡다. "이런~ 누가 신문을 또 가져가 버렸네."
티 브이를 켰다. "저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 였던가?" 조금 이상했지만, "아침에 나오니 아침 드라마겠지." 점점 부실해 지는 내 기억을 탓하며 늘 하던 대로 토마토 쥬스를 만들어 '아침밥' 대신 먹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신문을 하나 더 보내 달래려고 전화 번호 책에서 신문지국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려다가, 한번 더 살펴 보려고 현관 문을 열었다.
한차례 비가 퍼 붓더니 밖은 아까보다 더 캄캄하다. "아무리 비가 오지만 너무 어둡네." 너무 어둡다는 생각에,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든다. 그러다가 생각해 냈다. 오후 5시 쯤 들어와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잠이 들었던 것을~
'딱 일주일만 나갈 일 없이 왼 종일 책보고 글 쓰고 했으면' 오늘 빈 자리 없는 일산 백병원 영안실 지하 주차장에서 쩔쩔 매다가 울컥 짜증이 나서 투덜 거렸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가.
나는 지금 시간의 미로에 갇혀 있다.
|
'예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移事 <법원리에서의 마지막 밤> (0) | 2009.05.24 |
|---|---|
| <찔레꽃 울타리> (0) | 2008.07.13 |
| 꼬마 괴물과 서울 나들이 (0) | 2007.09.08 |
| 급한 성미 (0) | 2007.09.08 |
| 불출 할미 (0) | 2007.09.08 |